[책 감상/책 추천] 아리 투루넨, 마르쿠스 파르타넨, <매너의 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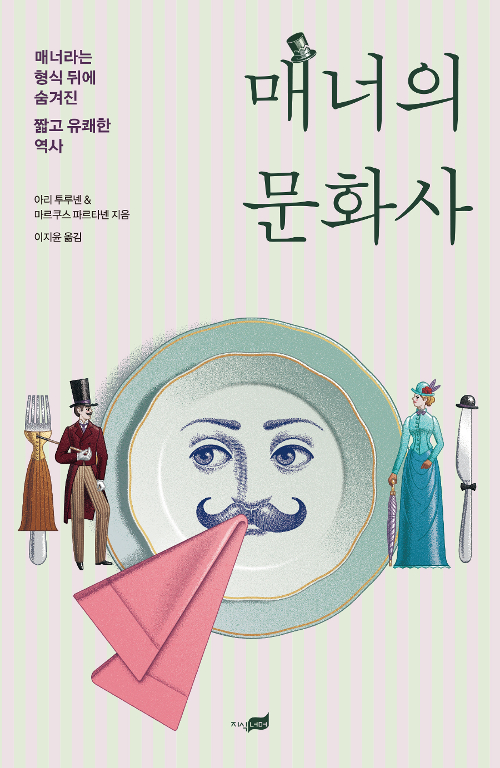
각 시대별로 '매너'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책이다.
매너의 시작, 몸가짐과 바디랭귀지, 인사법, 식사 예절, 자연 욕구와 분비물, 눈물과 웃음, 공격성, 성생활, 디지털 중세시대 등으로 각 장이 구분돼 있다.
사실 매너라는 게 시대에 따라, 그리고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건 굳이 이 책을 읽지 않아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 대중의 사고방식이 바뀌면서 매너도 같이 변화한 과정을 알아보는 것은 퍽 재미있는 일이다.
매너가 곧 예의라고는 할 수 있지만, 예의가 곧 도덕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저자들은 1장 '매너의 시작'에서 이렇게 썼다.
하지만 그들이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정교하게 정해진 행동 규범을 외형적으로만 따른 것에 불과하다. 성폭행 미 혐의로 체포된 도미니크 슈트라우스 칸(Dominiquer Strauss-Kahn) 전 IMF 총재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전 이탈리아 대통령만 보더라도 훌륭한 매너가 곧 선한 마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궁전을 찾은 손님 앞에서 우아하게 차려입고 형식상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대화를 이끌어 갈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 책은 눈앞에 드러나는 형식의 이면을 파고들어 '도대체 훌륭한 매너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자 한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과연 훌륭한 매너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는지, 아니면 그저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인간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정신적 울타리를 그렇게 부르는 것에 불과한지를 탐구하려 한다. 이를 위해선 하나의 행동 규범으로 묶여 버린 유럽 연합을 떠올리기 전에, 일단 유럽의 매너가 형성된 역사와 몇몇 엄격한 행동 규칙이 갖는 이른바 '미덕'이라는 것의 실체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매너라는 건 일종의 구분선으로 작용한다. 예의가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들, 고귀한 사람들과 천한 사람들, 내국인과 외국인 등.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가 다른 집단의 문화보다 낫다는 생각의 뿌리는 매우 깊다. 고대 이집트 떄부터 이미 인간은 자신의 견해를 다른 민족들과 차별화하려고 노력했다.
고대 그리스어에 나타난 '야만(barbar)'의 개념을 살펴보자. 그리스인들의 귀엔 외국어가 마치 '봘봘(barbar)' 하고 개가 짖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래서 그들은 외국인들을 개와 같은 발달 수준에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인도어에도 외국인을 비하하여 부르는 '바르바라(barbar)'란 단어가 있다. 이 비속어는 어원학적으로 그리스어의 '야만'과 유사하다. 산스크리트어를 잘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그 언어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r'을 더듬거리면서 발음하는 것을 흉내 내 '바르바라'라고 부른 것이다. 곧 이 단어는 '어릿광대'나 '멍청이'의 동의어로 자리잡는다.
식사 예절도 마찬가지다.
세계가 자기네 저녁 식탁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건 인간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생각 중 하나다. 사람들은 자신의 음주 습관이나 식문화는 미덕으로 여기면서, 이웃의 습관에는 자꾸만 천반하다거나 야만적이라는 꼬리표를 갖다 붙이려고 한다.
내가 가장 흥미롭게 여겼던 건, 6장 '눈물과 웃음'에서 저자가 보여 주는, 이 두 가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또는 그렇게 보이는) 감정에 대한 '매너'가 지금과 얼마나 달랐느냐 하는 점이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우는 것이 금지되었던 시대에도 눈물을 허용하는 몇 가지 상황이 있었다. 이는 비단 극장 안에 한정되지 않았고 일상에서 우는 일이 가능했다. 그때 적용되는 규정은 한 가지, 즉 품위가 있을수록 더 많이 운다는 것이었다.
성 안에서도 눈물이 때때로 유용한 도구로 쓰였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ㅅ인지 아닌지는 크게 중요치 않았다. 백년전쟁 당시 부르고뉴 공작이었던 필리프 3세를 회유하기 위해 프랑스 왕이 파견한 특사는 항상 눈물을 흘렸다. 젊은 공작이 송별회를 열어 주면 모두가 들으라는 듯 소리를 내어가며 울었다. 부르고뉴 궁에 묵은 루이 11세도 몇 번이고 눈물을 흘렸다. 부르고뉴와 프랑스, 잉글랜드가 아라스에서 연 평화회의에 파견된 특사들이 감동적인 발언을 하면 청중들은 말없이 바닥을 내려다보며 코를 훌쩍이고 흐느끼다가 결국은 엉엉 울어 버렸다.
옛날엔 이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운다고 해서 난처할 게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울 수 있는 능력은 연민과 품위의 증거였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지체가 높은 사람일수록 감정이 풍부해야 한다고 믿었다. 눈물이야말로 엘리트 계층이 '감정적일 수 있는 특권'을 눈에 보이게 드러낼 수 있는 도구였다. 당시를 지배하던 사고방식은 이 특권은 타고나는 것이었다. 일반인들의 땀이나 짐승들의 배설물과 다르게 눈물은 귀족 계층의 감수성을 나타내는 정결한 분비물로 대접받았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 <Blast from the Past(1999, 블래스트)>에서 남자 주인공 애덤(Adam, 브렌단 프레이저 분)은 이렇게 말한다.
"매너는 다른 이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 쓴다는 걸 보여 주는 방법이죠(Manners are a way of showing other people we care about them.)."
이 말을 들은 트로이(Troy, 데이브 폴리 분)는 여주인공 이브(Eve, 알리시아 실버스톤 분)에게 이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친절한 남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글쎄, 그거(남주의 완벽한 테이블 매너)에 대해서도 물어봤지. 그가 말하기를, '좋은 매너를 지키는 건 다른 이에게 우리가 그들을 존중한다는 걸 보여 주는 방법일 뿐이에요'라는 거야. 와, 난 그걸 몰랐네. 난 그게 그냥 거만하게 구는 방법인 줄 알았잖아. 그리고 그거 알아?" (이브: 뭐?) "그는 내가 신사고 네가 숙녀라고 생각한대."
Troy : You know, I asked him about that. He said, good manners are just a way of showing other people we have respect for them. See, I didn't know that, I thought it was just a way of acting all superior. Oh and you know what else he told me?
Eve : What?
Troy : He thinks I'm a gentleman and you're a lady.
애덤은 핵 전쟁이 난 줄 알고 몇십 년간 지하 벙커에서 살아 온 부모님에게 잘 배워서 정말 티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순수 청년이고, 트로이와 이브는, 음, 찌들대로 찌든 현대인이라고 할까.
그래서 애초에 무엇을 위해 매너라는 게 생긴 건지도 모르고, 매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이 살아 온 이들이다(사실 대부분의 현대인이 그렇지만).
그런 그들이 완벽하게 예의 바르고 스윗하기 짝이 없는 애덤을 만났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는가.
내가 책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소 뜬금없이 이 영화 이야기를 꺼낸 건, 매너에 대해 생각할 때 애덤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다.
매너, 예의, 예절이란 게 나라마다, 문화마다, 또 시대마다 다른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특정한 나라, 문화, 시대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서 타인에 대한 존중을 보여 줄 수 있을까?
매너의 형태는 달라도 결국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보여 주는 '틀, 방식'이 곧 매너 아닌가.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가 기사들이 활약하던 중세 유럽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가위나 칼 등 날카로운 칼붙이를 누군가에게 건네줄 때 상대가 날카로운 쪽을 잡아야 하도록 건네준다면 그런 행위는 분명히 상대를 불쾌하고 불편하게 할 것이다.
손잡이를 상대가 안전하게 잡을 수 있도록 방향을 돌려서 건네주는 게 (현대 우리나라에서) 기본 매너라는 것은 유치원 애들도 안다('이렇게 날카로운 걸 잡으면 아야 하잖아~' 이 정도로만 설명해 줘도 애들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아무리 좋아하고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매너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매너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다시금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
한 줄 요약: 매너라는 규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재밌지만, 매너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드는 점이 더 마음에 드는 책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영화도 짱 재미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라! 브렌단 프레이저가 엄청 잘생겼고 알리시아 실버스톤이 짱 예쁘게 나온다!ㅇ)
'책을 읽고 나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 감상/책 추천] 심너울, <세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점프의 횟수> (0) | 2020.10.26 |
|---|---|
| [책 감상/책 추천] 개리 비숍, <내 인생 구하기> (0) | 2020.10.23 |
| [책 감상/책 추천] 베키 앨버탤리, <첫사랑은 블루> (0) | 2020.10.16 |
| [책 감상/책 추천] 필 바커, <남자다움의 사회학> (1) | 2020.10.05 |
| [책 감상/책 추천] 곽재식, <지상 최대의 내기> (0) | 2020.09.28 |
| [책 감상/책 추천] 캐서린 A. 샌더슨, <생각이 바뀌는 순간> (0) | 2020.09.21 |
| [책 감상/책 추천] 네이딘 버크 해리스, <불행은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가> (0) | 2020.09.14 |
| [책 감상/책 추천] 톰 필립스, <인간의 흑역사> (0) | 2020.0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