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감상/책 추천] 양다솔, <아무튼,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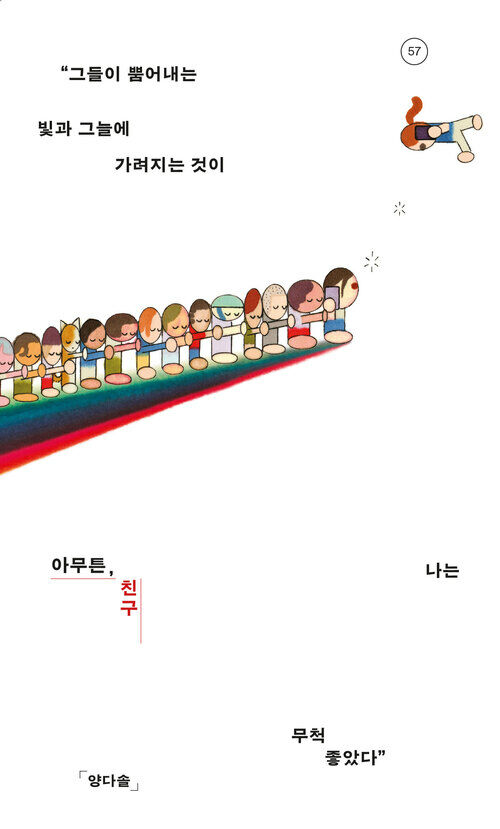
케일린 셰이퍼는 <여자들을 위한 우정의 사회학>에서 이렇게 썼다.
“집에 도착하면 문자해.”
여성들이 이 말을 하는 건 보통 짜릿한 저녁시간을 보내고 헤어질 때다. 저녁을 함께 먹었을 수도 있고, 콘서트에 갔을 수도 있고, 칵테일 바에 갔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다음날 피곤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늦은 시간까지 수다를 떨었을 것이다. 비밀 얘기를 속삭였을 수도 있고, 서로 의외의 칭찬을 해줬을 수도 있고, 어쩌면 두 가지를 모두 했을 수도 있다. 혹은 춤을 췄을 수도 있고 기쁨의 포옹을 했을 수도 있다. 술기운에 들떴을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한 애정을 새삼 느끼고 환희에 휩싸였을 수도 있다.
나의 절친한 친구 루시와 나는 브루클린에 사는데 두 집 사이가 몇 블록밖에 되지 않는다. 둘이 함께 저녁시간을 보내고 헤어질 때면 나도 루시에게 집에 도착하면 문자를 보내라고 말한다. 둘 중 하나가 “사랑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집에 도착하면 문자해”라고 대답한다. 실은 둘 다 똑같은 의미다.
(…)집에 도착하면 문자하라는 당부, 그리고 도착해서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는 우리를 연결해주는 끈이다. 그 끈은 우리가 혼자 또는 함께 보낸 수많은 순간을 연결해주고, 외로움에 위축되거나 두려움에 떨거나 분노에 휩싸이거나 슬픈 일을 겪을 때, 혹은 그냥 지루할 때도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킨다. 그런 문자는 또한 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마음을 전한다.
‘내 마음은 항상 네 곁에 있어. 헤어져도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네 앞에 서 있는 지금뿐 아니라 네가 나를 필요로 하면 언제 어디든 달려갈 거야.’
<아무튼, 친구>는 이렇게 ‘집에 도착하면 문자해’에 담긴 마음을 조금 길게 풀어 쓴 에세이라 할 수 있겠다. 양다솔 작가는 우정에 목숨을 건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뫄뫄의 친구’라고 소개하는 데 전혀 거리낌이 없을 정도다.
내 소개는 간단하다. “양다솔입니다. ○○의 친구입니다.” 누군가 “무슨 일 하는 분이세요?”라고 물으면 멀쩡히 회사 다니는 직장인임에도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의 친구입니다. 그것이 제1 직업입니다. 아직 명함은 못 팠습니다. 갖가지 사이드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를 별로 설명해주지 않네요.” 특히 잘 보이고 싶은 상대에게는 여러 명을 열거하기도 했다. “아시죠? 저는 ○○의 친구이자 ○○과도 절친하고 ○○에게는 유일한 친구라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의 친구시죠?” 하고 상대 쪽에서 물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나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대관절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그냥 ○○의 친구인 것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을 뿐이었다. 혹자는 내게 어떤 이의 친구로 먼저 인식되는 것이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 몹시 놀랐다. 누군가의 친구로 소개되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들이 뿜어내는 빛과 그늘에 가려지는 것이 나는 무척 좋았다.
살다 보니 나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는 걸 알았다. 어떤 이에게는 친구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였다. 그런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랐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하고 빤히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친구에게 별 시간을 쓰지 않았다. 친구는 가족도, 애인도, 일도 아니어서라는 거였다. 맞는 말이었지만 내게는 틀린 말이었고, 나는 처음으로 자문하게 되었다. 대체 내가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었던 것인지. 그 기원이 너무 까마득하여 어느 날 엄마에게 물었다. (…)
그의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이슬아 작가, 가수이자 작가인 요조, 그리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정지음 작가까지! 유명한 사람들만 멋진, 좋은 친구라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 (내 친구들아, 내 마음 알지?), 아니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쓰는 작가들이랑 친구일 수 있다면 정말 너무 설렐 것 같다. 특히 정지음 작가님…🥰❤️ (나는 <젊은 ADHD의 슬픔>, <언러키 스타트업>, <우리 모두 가끔은 미칠 때가 있지> 등, 정지음 작가님 책을 모조리 섭렵했고 책 후기도 썼다. 링크를 참고하시라.) 이 친구들은 하나같이 개성이 독특하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내가 한참 하소연을 늘어놓으면 요조 형은 그게 뭐가 됐든 이렇게 말했다. “야, 양다솔. 너 나랑 똑. 같. 다.” 정지음 작가는 여기가 감옥이 아니라는 점을 자꾸만 강조해 말했다. “진심으로, 감옥에 갇힌다고 상상해봐요…. 봐봐요… 지금이 훨씬 낫죠….” 공주는 말했다. “네가 공주 개미가 되었다고 생각해봐. 백성들이 너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고. 네 어깨에 개미 왕국 전체가 달려 있단 말이야.” 혹은 이렇게 말했다. “진짜 귀여운 희귀 곤충들 영상을 찾아봐. 세상에 얼마나 귀여운 친구들이 많은지. 보다 보면 하루가 가는 게 우스울 정도라니까. 얼마 전엔 내가 우연히 이 친구를 발견했…”라고 했다. 스투키는 말했다. “좋았어. 아주 좋아….”
그러나 그들이 전화를 받으면 하루는 달라졌다. 바위처럼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있던 것들은 수화기를 들고 그것들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훌쩍 가벼워졌다. 골라도 골라도 끝없이 솟아나던 비관의 돌들이 잠시 딴청을 피웠다. 그들이 웃는 순간 그것들은 돌멩이처럼 작아져 내 손바닥 위를 빙그르르 굴러다녔다. 고통스러웠던 기억 어딘가에 귀여운 구석마저 있어 보였다. 비로소 그것은 일화가 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가 흘러갔다. 전화를 끊고 나면 한동안은 잘 지낼 수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처럼 모든 것은 평화를 찾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잠시나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사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친구들에게 애틋하고 간절한지, 솔직히 심적으로 괜찮으신 건지 살짝 걱정도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여행에서 돌아와 피곤할 텐데 친구의 부탁에 곧바로 지친 몸을 이끌고 친구의 머리를 해 주러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었지만) 눈이 펑펑 오는 날에 자전거를 타고 친구에게 달려가고, 몸이 아픈데도 친구의 부탁대로 원고를 쓰다가 그 글을 끝마치자마자 기절한 이야기 등이 언급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내가 37도가 넘는 꽤나 높은 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고 매우 화가 났다. 점심때 친구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눈치도 없이 아프기 시작한 몸이 짜증스러웠지만 친구와 만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되는 일이었다. 나는 무슨 일이 있냐는 듯 벌게진 얼굴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 친구는 “어디 아픈 거 아니야?”라고 물었고 나는 전혀 신경 쓸 것 없다고 말하며 덧붙였다. “어서 놀자.”
한번은 친구가 부탁한 원고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몸이 심상치 않았다. 갑자기 열이 펄펄 나더니 머리가 꽝꽝 울리고 땀이 뻘뻘 났다. 나는 일단 약을 먹고 버티고 앉아 있다가 동네 내과에서 링거를 맞고 온 뒤 울면서 계속 글을 썼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친구가 곤란에 빠질 것이었다. 친구에게 완성된 글을 전송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바로 응급실에 실려 가 뇌수막염 판정을 받고 그대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쪽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 친구들이 나와의 약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서 그 이유를 “졸리다”라든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라든지 “할 일이 많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원망으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만남을 그런 하잘것없는 이유로 취소하다니.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설레고 기다리며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던 나에게 해도 해도 너무한 처사였다. 약속이 취소될 때마다 물었다. “넌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긴 하니?”
친구도 친구인데 본인 몸부터 챙기셔야… 🥲 하지만 우정에 대한 그의 이야기에서 친구들에 대한 너무나 큰 사랑이 뚝뚝 묻어나서 읽는 내가 다 흐뭇해진다. 책의 후반에는 ‘우정’ 또는 ‘친구’라는 책의 큰 주제와 무관해 보이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좀 아쉽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흥미로운 이야기에는 변함이 없다. 이 책 덕에 양다솔이라는 작가를 알게 되어 너무 기쁘다.
'책을 읽고 나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 감상/책 추천] 듀나 외 8인, <악인의 서사> (0) | 2023.09.13 |
|---|---|
| [책 감상/책 추천] 에밀리 헨리, <우리의 열 번째 여름> (0) | 2023.09.08 |
| [책 감상/책 추천] 권진영, <부부의 영수증> (0) | 2023.09.04 |
| [월말 결산] 2023년 8월에 읽은 책들 (0) | 2023.09.01 |
| [책 감상/책 추천] 김아미, <온라인의 우리 아이들> (0) | 2023.08.23 |
| [책 감상/책 추천] 제시 싱걸, <손쉬운 해결책> (0) | 2023.08.21 |
| [책 감상/책 추천] 카라타치 하지메, <저는 왼손잡이도 AB형도 아니지만> (0) | 2023.08.18 |
| [책 감상/책 추천] 신견식, <콩글리시 찬가> (2) | 2023.08.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