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말 결산] 2025년 12월에 읽은 책들
2025년 12월에 읽은 책들은 총 8권.
⚠️ 아래 목록에서 저자 이름과 책 제목 부분을 클릭하면 해당 서적에 대한 서평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이퍼링크가 없는 책은 서평을 따로 쓰지 않은 책입니다. 그 경우, 별점 아래에 있는 간략한 서평을 참고해 주세요.
 |
도널드 웨스트레이크, <액스> ⭐️⭐️⭐️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바탕이 되는 원작 소설. 제지 회사에서 해고당한 주인공이 재취업을 위해 자신의 라이벌이 될 만한 인물들을 하나씩 제거한다는 줄거리는 동일하다. 이 소설의 놀라운 점은, 1997년에 처음으로 출간된 소설인데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로 들어맞는 구석이 있다는 거다. 예를 들어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해서 사람들이 원할 만한 좋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짚어내는 점이라든지, 해고당한다는 일의 가장 끔찍한 점은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는 점이라든지. 이 소설(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영화)이 나름대로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는 점이 다크 코미디의 완성이라 하겠다. |
 |
김지원, <메모의 순간> ⭐️⭐️⭐️ 우리는 무엇을 위해 메모를 하는가. 나중에 글로 쓸 글감을 모으기 위해? 내가 추천하기도 한 뉴스레터 <인스피아>를 운영했던 저자는 메모라는 행위의 즐거움을 예찬한다. 나중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즉 어떤 쓸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더 효율적이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회에 대한 작은 저항이랄까. 그런 저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읽으면 참 좋을 책. 위로도 되고 휴식도 된다. |
 |
심조원, <우렁이 각시는 당신이 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 우리나라 설화 및 옛이야기를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책. 제목에도 있는 우렁이 각시 이야기,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콩쥐팥쥐 이야기 등 한국인이 이미 잘 알고 있을 이야기도 있지만 전혀 들어 본 적 없는 이야기들도 있다. 솔직히,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이야기의 경우 저자가 인용하는, 생생한 입말로 채록된 구비 문학 버전을 따라가기가 조금 어렵긴 했다. 그래도 같은 이야기를 현대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걸 좋아한다면 읽어 볼 만하다. 비슷한 맥락의 책인 구오의 <선녀는 참지 않았다>도 같이 권한다. |
 |
루만 알람, <세상을 뒤로하고> ⭐️⭐️⭐️ 동명의 영화에 원작이 되는 소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솔직히 영화가 소설보다 나았다.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세상을 뒤로하고’ 여름 휴가를 떠난 한 백인 가족, 남편 클레이와 아내 어맨다, 그리고 아들 아치와 딸 로즈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집에서 머문다. 그런데 휴가 첫날 저녁, 갑자기 한 흑인 부부가 노크를 하더니 자기들이 원래 이 집의 주인이라며, 도시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여기에 지내러 왔다고 말하는데… 개인적 해석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영화가 조금 더 스릴 있고 ‘와 진짜 내가 모르는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라는 느낌을 주었다. 소설은… 거의 후반부에 가서야 뒤늦게 일이 심각해졌다고 느꼈기에 영화 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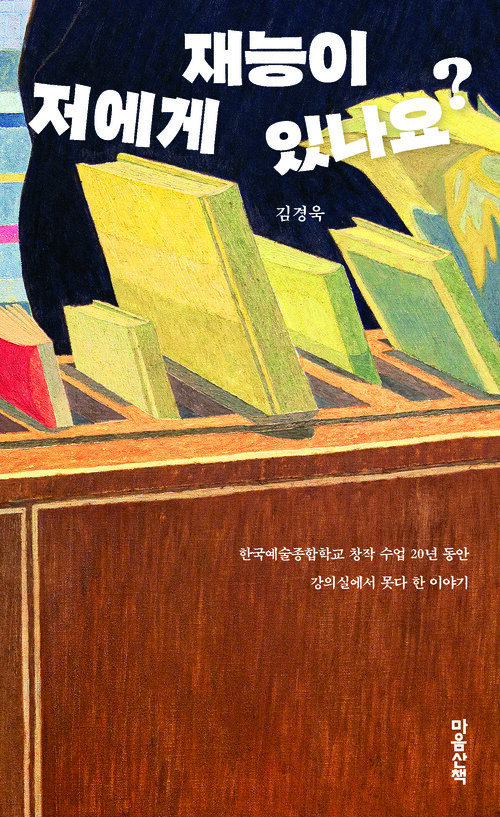 |
김경욱, <저에게 재능이 있나요?> ⭐️⭐️⭐️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 <내 여자친구의 아버지들>, <개와 늑대의 시간> 등 여러 작품을 쓰고 김승옥문학상, 이상문학상까지 수상한 작가 김경욱이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며 느낀 글쓰기의 본질에 관한 에세이. 제목이 너무나 짜릿할 정도로 공감이 되어서 교보문고에서 사서 읽었는데, 솔직히 제목이 다 했다고 본다. 작가로서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겪은 이런저런 일화들 위주인데, 예를 들어서 제목처럼 학생이 ‘저에게 재능이 있나요?’라고 물어봤다는 것, 글을 쓸 때 (특히 작가 개인적으로) 제목이 중요하다고 느낀다는 점, 자기도취에 빠져서 글을 쓰지 말라는 조언 등이 그것이다. 나쁜 글은 아닌데 내가 이 작가 작품을 한 권도 읽어 본 적이 없어서 과연 이 작가를 내 롤 모델로 삼고 싶은지는 모르겠고, 또한 중간에 두 번 나오는 ‘짧은 소설’도 딱히 왜 실려 있는지 모르겠다. 특히 <히든 싱어>를 패러디한 <히든 라이터>가 도대체 뭔데요? 글쓰기든 그림 그리기든, 뭐가 되었든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 보았을 절실한 질문을 제목으로 선정한 게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다. 하지만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어차피 그것은 개인이 각자, 스스로 알아서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이라 그런가. 남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웃소싱하려 했던 나를 반성합니다… |
 |
원도, <눈물 대신 라면> ⭐️⭐️⭐️ 내가 좋아하는 원도 작가의 음식 에세이. 제목에도 나와 있는 라면이라든지, 김밥, 짜장면, 조개전골 등 작가에게 의미가 있는 음식에 대한 짧은 에세이를 묶은 것이다. 가볍고 귀엽고 재미있는데, 각 꼭지가 정말 너무 짧아서 원도 작가가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이를 보여 줄 분량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한 꼭지는 대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꼭지는 음식 소개, 두 번째가 도입이고 세 번째에 벌써 끝이다. 무슨 이야기를 깊게 할 사이도 없이 후루룩 끝나 버려서 무척 아쉬웠다. 꼭지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각 글에 깊이를 줄 수 있게 분량을 조금 더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교보문고에서 돈을 주고 사서 읽었기에 더욱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밀리의 서재에 최근 들어와 있으니, 그걸 통해 읽으면 이런 생각은 조금 덜할 수도? 하지만 사실 이건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진짜 기가 막히게 쓴 글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에 나오는 아쉬움인 게 분명하다. <경찰관속으로>처럼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슬프고 깊은 글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수영장 정도, 귀엽고 재미있지만 때로 감동도 있는 그런 평범한 에세이를 읽고 싶었던 건데… 분량은 160쪽밖에 안 되는 <아무튼, 언니>에서도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다 했잖아요. 이건 그것보다 조금 더 긴데(종이책 기준 208쪽) 한 편 한 편이 너무 짧아서 깊이를 논할 정도도 못 된다는 사실이 너무 아쉽다. 어쨌거나 저는 작가님의 다음 책을 기대하겠습니다! |
 |
클레어 키건, <이처럼 사소한 것들> ⭐️⭐️⭐️ 아일랜드에 실제로 있었던 ‘막달레나 세탁소’(위키페디아 페이지 참고) 사건을 이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다룬 소설. 132쪽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전모를 어떤 권위를 가진 인물(예컨대 경찰이나 탐정)이 직접 파헤치는 형태는 아니다. 빌 펄롱이라는 한 남자가 수녀원에서 창고에 갇혀 있던 아이를 구하는 이야기인데, 킬리언 머피를 주연으로 한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제목처럼 사소하고 소소하며, 큰 긴장감이나 엄청난 사건은 없지만 큰 의미를 가진 소설이다. 극 중 시간적 배경도 크리스마스 시기인데 나도 마침 이걸 그 즈음에 읽어서 더 좋았다. |
 |
메리 로치, <죽은 몸은 과학이 된다> ⭐️⭐️⭐️ ’죽은 몸’, 시체를 문화적, 과학적, 의학적 등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논픽션. 주제가 아무래도 으스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정말 글을 재미있게 잘 쓰기 때문에 웃으면서 읽을 수 있다. 약간의 과학적 호기심과 유머 감각만 있어도 이 책을 즐길 수 있을 듯. |
반응형
'책을 읽고 나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 감상/책 추천] 심조원, <우렁이 각시는 당신이 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1) | 2026.01.09 |
|---|---|
| [책 감상/책 추천] 김지원, <메모의 순간> (1) | 2026.01.07 |
| [책 감상/책 추천] 도널드 웨스트레이크, <액스> (1) | 2026.01.05 |
| [연말 결산] 2025년 제이미의 독서 및 영화 감상 통계 (0) | 2026.01.02 |
| [책 감상/책 추천] 미야케 카호, <덕후의 글쓰기> (0) | 2025.12.24 |
| [책 감상/책 추천] 스티븐 킹, <돌로레스 클레이본> (1) | 2025.12.19 |
| [책 감상/책 추천] 스티븐 킹, <피가 흐르는 곳에> (2) | 2025.12.15 |
| [책 감상/책 추천] 마라 비슨달, <남성 과잉 사회> (2) | 2025.1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