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감상/책 추천] 구달, <아무튼, 양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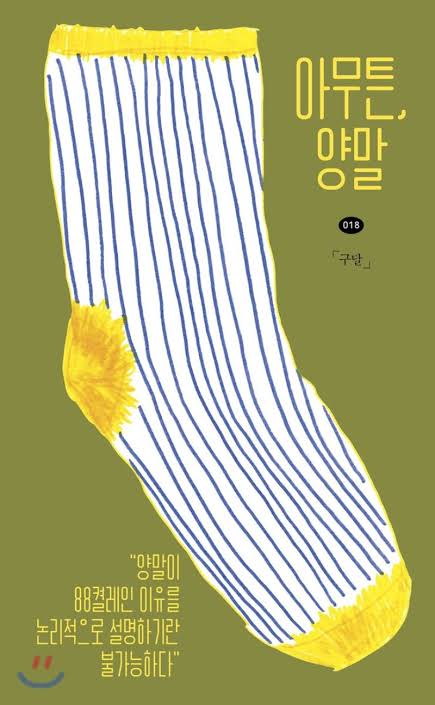
오늘 리뷰를 쓸 책은, 내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한 책 <일개미 자서전>의 저자 구달이 쓴 <아무튼> 시리즈의 한 편이다.
2019/10/04 - [책을 읽고 나서] - [책 감상/책 추천] 구달, <일개미 자서전>
[책 감상/책 추천] 구달, <일개미 자서전>
[책 감상/책 추천] 구달, <일개미 자서전> 제목에서부터 느낌이 오겠지만, 저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 책은 저자가 "갤리선의 노예처럼" 일하는 삶에 환멸을 느끼고, 직장 생활이 자신을 잡아 먹지 않도록 하기..
eatsleepandread.xyz
일단 저자는 책 첫머리에 이 책을 이렇게 소개했다.
아무래도 이 책은 양말 이야기를 빙자해 인생사의 희로애락을 털어놓는 대나무 숲이 될 것 같다. 양말을 반항의 무기로 휘두르고, 재정적 몰락을 양말 진열대 앞에 선 채 실감하며, 때로는 시스루 양말 한 켤레에 무너지고 마는 이야기. 마치 실크처럼 보이는 실켓 양말을 신고 한껏 작가인 척하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제 신은 수면양말에 코를 대고 킁킁 냄새를 체크한 뒤 오늘 하루만 더 신고 빨아도 되겠다며 두 발에 끼우고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출간 제안서의 첫 줄을 적기 시작하는 오늘 하루 같은 이야기.
저자는 양말을 너무너무 사랑해서(양말이 무려 88켤레나 된다), 양말에 대한 책을 쓰고 싶었단다.
그래서 먼저 샘플 원고를 쓰고 출간 제안서를 작성해 이 책의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출판사에서 먼저 제안받은 게 아니다!).
'그깟 양말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양말을 사랑할 수 있지?' 싶지만, 그러한 애정에서 양말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여럿 샘솟아난 게 틀림없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저자의 솜씨에 감탄하게 된다. 양말이라는 하찮고 일상적인 소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뽑아내는 게 정말 대단하다.
내가 제일 놀란 건, 저자가 소개팅 때마다 신는 '페이크 삭스'라는 소재를 가지고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라는 다소 진지한 주제를 풀어낸 꼭지에서였다.
일부분을 조금 인용해 보겠다. 왜냐하면 너무 웃겨서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
서울 강서권 직장인과 소개팅이 성사되었을 때만 방문하는 여의도 IFC 몰에서, 역시 강서권 직장인인 소개팅 상대가 커피를 놓고 마주 앉은 내게 몸을 기울이더니 은밀히 속삭였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국정원에서 일하셨어요."
대화 맥락상 아버지의 직업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었다. 아버지의 환갑잔치를 얼마나 성대하게 열어드렸는지는 묘사하고 있기는 했지만, 귀빈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초청했다던가 사실 잔치는 페이크고 물밑에서 대북공작이 벌어지고 있었다던가 하는 전개는 아니었다.
"아."
'어쩌라고'가 생략된 나의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대화 중단이라는 참사를 가져왔다. 어쩔 수 없었다. "아버님께서 댓글 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네요"라는 말로 대화를 이어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역시, <일개미 자서전>의 저자답다. 역시 날 실망시키지 않는군!
대충 이렇게 웃기게 시작했지만 그다음에 저자는 이 소개팅에서 얻은 깨달음을 공유한다.
잘난 아버지의 존재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모습, 정말 멋대가리 없다고 속으로 욕했다. 하지만 지지리 멋없고 지루한 이야기에도 내내 웃고 눈 맞추며 경청하는 척한 나는 또 어떤가. 양말이면서 양말처럼 보이지 않는 페이크 삭스를 신고, 나이면서 나답지 않으려고 애쓰는 내 모습이라니. 개성을 죽이고 소개팅 필승 전략만 따르면 적당히 먹힐 거라고 생각한 나의 얄팍한 계산은 산대방 눈에 얼마나 멋없게 비쳤을까. 어쩌면 조금은 괜찮았을지도 모르는 진짜 모습은 발목 아래로 꼭꼭 감춘 채, 서로 제일 멋대가리 없는 면만 보란 듯 전시한 꼴이다.
이 외에도 양말을 빨고 개는 일에서 무급 노동인 가사 노동에 대해 생각해 보는 꼭지도 꽤 여운이 있다. 생각할 거리를 준달까.
아까 책 첫머리에서 '양말을 반항의 무기로 휘두'른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설명하자면 이렇다.
저자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복장 규제가 철저했는데, 검정 스타킹은 착용 금지였단다. 이유는 너무 하찮다. 학교 이사장이 교정을 둘러보다 검정 스타킹에 흰 양말을 착용한 여학생을 보고 그게 보기 흉했다고 생각했다나.
그래서 저자는 아직도 겨울이면 반항의 의미로 종종 검정 스타킹에 흰 양말을 매치한다고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컴퓨터 사인펜 룩'이 예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거기에서 자유의지를 확인받는 기분이 든다나.
줄여 입은 교복을 압수당하거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린 적(심지어 강제로 묶인 적)도 있었다. 한데 그런 일은 그다지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던 것 같다. 학생이니까 그 정도 통제는 감수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양말은 사정이 달랐다. 양말까지 간섭하는 건 '그 정도'를 넘어서는 문제였다. 알베르 카뮈는 불세출의 에세이 『반항하는 인간』에서 "농(프랑스어로 '아니다', '안 된다'라는 뜻)"은 '여기까지는 좋지만 이 이상은 안 된다' '당신, 너무하지 않은가?'의 의미라고 했다. 바로 그거였다. 머리카락 색깔까지는 좋지만 양말과 스타킹의 색 조합까지 단속하는 건 너무하지 않은가? (...)
마지막으로 마음에 들었던 꼭지 하나만 더.
'양말 계급론'은 저자가 마음에 드는 양말과 그러지 않은 양말을 구분하는 이야기다. 4단 서랍장의 첫 번째 칸에는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예쁜 양말"을, 두 번째 칸에는 "약속 없이 홀로 동네를 어슬렁거릴 때" 신는 양말을 넣었다.
1번 칸 양말은 브라만이고, 2번 칸 양말은 수드라다. 그런데 브라만 양말이 수드라 양말보다 비교도 안 되게 많아 역피라미드 모양이 돼 버렸다.
그런데 저자가 프리랜서로 전향하자 외부인과 접촉할 일이 줄어들고, 2번 칸 양말만 주로 꺼내 신게 되었다.
저자는 예쁜 양말을 신고 싶으면 그냥 평소에도 브라만 양말을 신으면 된다는 걸 깨닫고 다시 1번 칸에서 브라만 양말을 꺼내 대대적으로 2번 칸으로 이동시켰고, 양말 계급은 정상 피라미드 모양이 되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특별한 일, 좋은 일을 기다리지 말고,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압박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의미에서 예쁜 양말(아니면 옷)을 챙겨 신자는(입자는) 것이다.
필력 넘치는 저자와 '양말'이라는 가벼운 소재가 만나 유쾌하면서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 탄생했다.
책 읽기가 습관이 안 되신 분이나, 읽기 쉬운 책을 찾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아무튼> 시리즈를, 그중에서도 <아무튼, 양말>을 추천하고 싶다.
'책을 읽고 나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 감상/책 추천] 이종철, <까대기> (0) | 2020.03.02 |
|---|---|
| [책 감상/책 추천] 류은숙, <아무튼, 피트니스> (0) | 2020.02.21 |
| [책 감상/책 추천] 김혼비, <아무튼, 술> (0) | 2020.02.19 |
| [책 감상/책 추천] 김성우, <단단한 영어 공부> (0) | 2020.02.17 |
| [책 감상/책 추천] 코디 캐시디, 폴 도허티, <그리고 당신이 죽는다면> (0) | 2020.01.15 |
| [책 감상/책 추천] 홍혜은, 김현, 이승한, 장일호, 이민경, 최현희, 서한솔, 솔리, 최승범, 김애라,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해> (0) | 2020.01.03 |
| [책 감상/책 추천] 나카무로 마키코, 쓰가와 유스케, <원인과 결과의 경제학> (0) | 2020.01.01 |
| [책 감상/책 추천] 조지영, <아무튼, 외국어> (0) | 2019.12.30 |



